-
뭘 알아야 제대로 된 회고를 하지요?!아하 스토리 2025. 5. 14. 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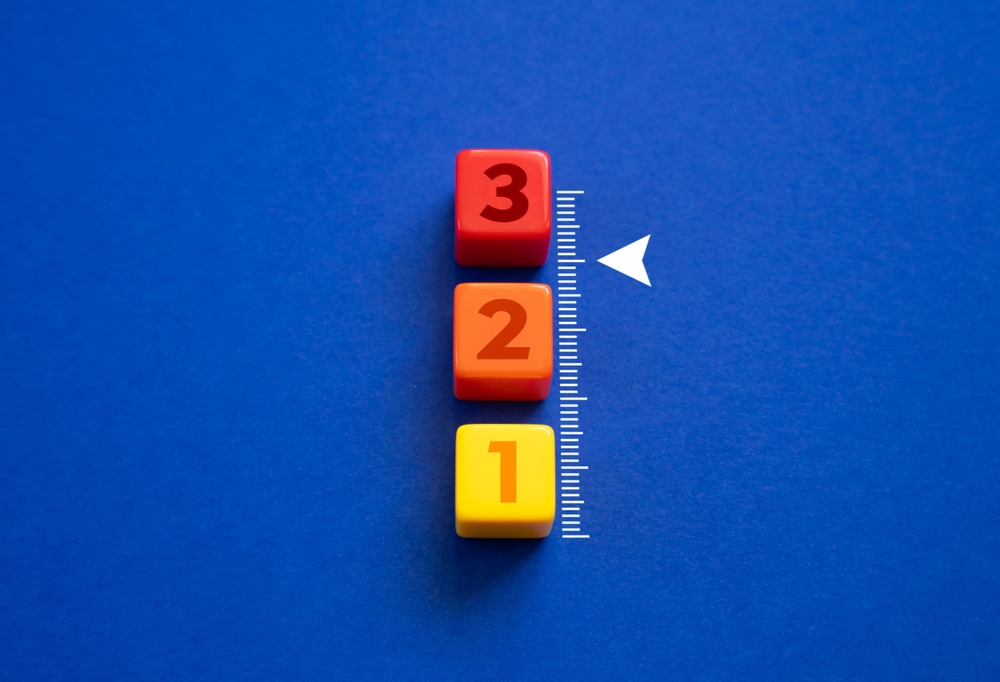
SNS의 순기능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남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회고’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주말의 기록은 물론이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소박한 일상의 장면들을 모아 각자의 회고를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올해의 영화, 올해의 책, 올해의 음악, 올해의 장소 등등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연말 시상식까지 펼쳐지곤 한다. 더 열심히 뒤를 돌아보고 내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곁들여 결실을 정리해보려는 의지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업무에서도 회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칠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눈앞의 과제들을 물리쳐나가야 하는 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명이니 말이다.
하지만 회고라는 게 그리 만만하기만 한 과정은 아니다. 서로가 해석하는 경험의 질이 모두 제각각이고 회고를 함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세운다는 것 역시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조직에서 회고라는 시스템을 단순히 지난 일을 공유하는 차원이나 과제의 결괏값만을 확인하는 장치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나은 회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무렵이었다. 종종 챙겨보는 육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어떤 칭찬이 아이에게 좋은 칭찬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는 무조건 ‘너무 잘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우리 OO이는 천재인가 봐!’처럼 막무가내식 칭찬보다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을 설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린 아이를 보면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진짜 예쁜 색깔들을 골랐네’와 같이 원래 그 일을 하는 게 꽤 쉽지 않은 거란 사실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 본인이 이룬 성취를 정확하게 짚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잘했다고만 하면 아이는 다음에 또 칭찬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면의 욕심만 커지고 나중엔 그게 아이를 짓누르기도 하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회고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뭔가를 평가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전에 원래 그 일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고, 그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 대다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쯤은 알고 있어야 평균을 설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디폴트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회고가 가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디폴트값은 뭘까?
그 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눈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마다 ‘요놈의 디폴트값은 뭘까?’를 고민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세워야 할 목표가 디폴트값을 얼마나 벗어나는 일인지 가늠해보기 시작했다. 그럼 투입해야 하는 리소스도, 들여야 하는 노력도, 실천해야 하는 방법도 모든 것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다.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할 때에도 좀 더 명확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수치나 지표로 딱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반응을 정성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의 일들은 평가의 기준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업무 하나를 해결해놓고서도 함께한 동료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요?’부터 ‘제 생각엔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큰 거 같아요’처럼 주관적인 반응들이 저마다 방향을 잃은 채 맴돌 때가 많으니 말이다.
그럴 때 작게나마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요소가 바로 이 디폴트값이다.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부터 공유하기 시작하면 서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일을 끝낸 후 이어지는 평가에서도 생각의 싱크를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다.
예를 들어,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소비자나 사용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일컫는 것인지, ‘먹혀들었다’는 게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고 ‘성공했다’는 건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나면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디폴트값을 인지한다는 건 문제의 부피와 질량을 예상하는 일임과 동시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작업이다.조선의 4번 타자란 별명으로 한국 야구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긴 이대호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타자는 열 번 중 세 번만 쳐도 3할 타자야. 그럼 팀의 중심 타자가 되지. 근데 3할 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남은 일곱 번을 어떻게 못 치느냐에 달려 있어. 내가 노리는 공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해.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세 번만 치자는 생각으로 덤빌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곱 번을 못 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잘 쳐서 타격왕을 한 게 아니라 똘똘하게 쳐서 타격왕을 한 거라니까.
수많은 실패에도 절대 굴하지 말라는 말은 종종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헛스윙이 디폴트라는 말은 새삼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 열 번 중 세 번만 잘 맞혀도 괜찮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노리는 그 공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타석이 쌓여 더 좋은 공들을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이 되는 것은 아닐까.
📍 출처: 기획의 말들 - 희미한 질문들이 선명한 답으로 바뀌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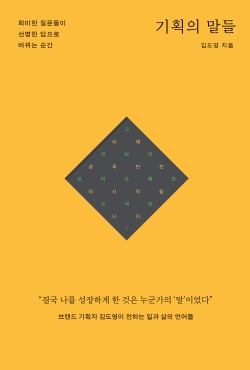
본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는 (주)위즈덤하우스에서 관리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재배포, 재편집, 도용 및 사용을 금합니다. aha.contents@wisdomhouse.co.kr
'아하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릿속에 없는 건 현실에도 없다’ 인풋 정리 노하우 (5) 2025.05.14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는 법 3가지 (1) 2025.04.16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일 뿐 (1) 2025.04.16 나를 돋보이게 해줄 커리어 브랜딩 글쓰기 3단계 (0) 2025.04.02 커리어 브랜딩, 내 일에서 존재감을 갖는 것 (0) 2025.04.02